보/도/자/료
| 수 신 | :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
| 발 신 | : | 전쟁없는세상 |
| 제 목 | : | [보도자료]국민의 양심의 자유 보호가 국가의 의무 – 오경택 유죄 판결에 부쳐 |
| 발 신 일 | : | 2019년 5월 17일(금) |
| 문 의 | : | 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02-6401-0514, 010-2878-0851 |
국민의 양심의 자유 보호가 국가의 의무
– 오경택 유죄 판결에 부쳐
-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5월 16일 10시 병역거부자 오경택에 대해 항소 기각, 즉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작년 헌재 결정과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 그러나 재판부의 유죄 선고는 병역거부의 양심에 대해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실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판단한 결과입니다. 또한 헌법 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 명시된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 대체복무 도입이 결정된 지금, 재판부와 정부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세심하게 기울일 것을 특별히 당부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붙임) 논평 : 국민의 양심의 자유 보호가 국가의 의무 – 오경택 유죄 판결에 부쳐
국민의 양심의 자유 보호가 국가의 의무
– 오경택 유죄 판결에 부쳐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5월 16일 10시 병역거부자 오경택에 대해 항소 기각, 즉 유죄를 선고했다. 작년 헌재의 결정과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데 오경택의 양심은 “유동적․가변적이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유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폭력에 대한 거부로서 병역거부의 양심을 판단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는 폭력은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폭력에 저항하는 양심 또한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맨부커상 수상으로 유명한 소설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시민군들의 사례에서 깊고 복잡한 양심의 타래를 살펴보기 좋은 구절이 나온다.
아니요, 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온 군인들이 어둠속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조의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소년이 온다』 117쪽
소설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었던 청소년은 도청에서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설명한다. 단순히 총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로 양심을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납작한 판단 기준으로 개인의 양심의 깊이를 측정할 수는 없다. 물론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심의 진위를 판단해야하겠지만, 그때에도 더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국가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헌법 19조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는 이러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실 구조 속에서 발현되는 양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양심의 자유라고 하면 비전향 장기수나 감옥행을 감내하는 병역거부자를 떠올리며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확고부동한 신념이나 감옥마저 인내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를 양심의 속성으로 떠올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헌법 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모든 국민, 보통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의미한다. 때로는 지향하는 바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기도 하는 보통의 사람들이 그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고자 할 때 그것을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번 재판부의 유죄 선고는 많이 아쉬운 결론이다. 양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너무 단순한 도식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 국가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복무 도입이 결정된 지금,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대체복무제도를 잘 안착시켜야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특히 재판부와 정부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세심하게 기울일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9년 5월 17일 전쟁없는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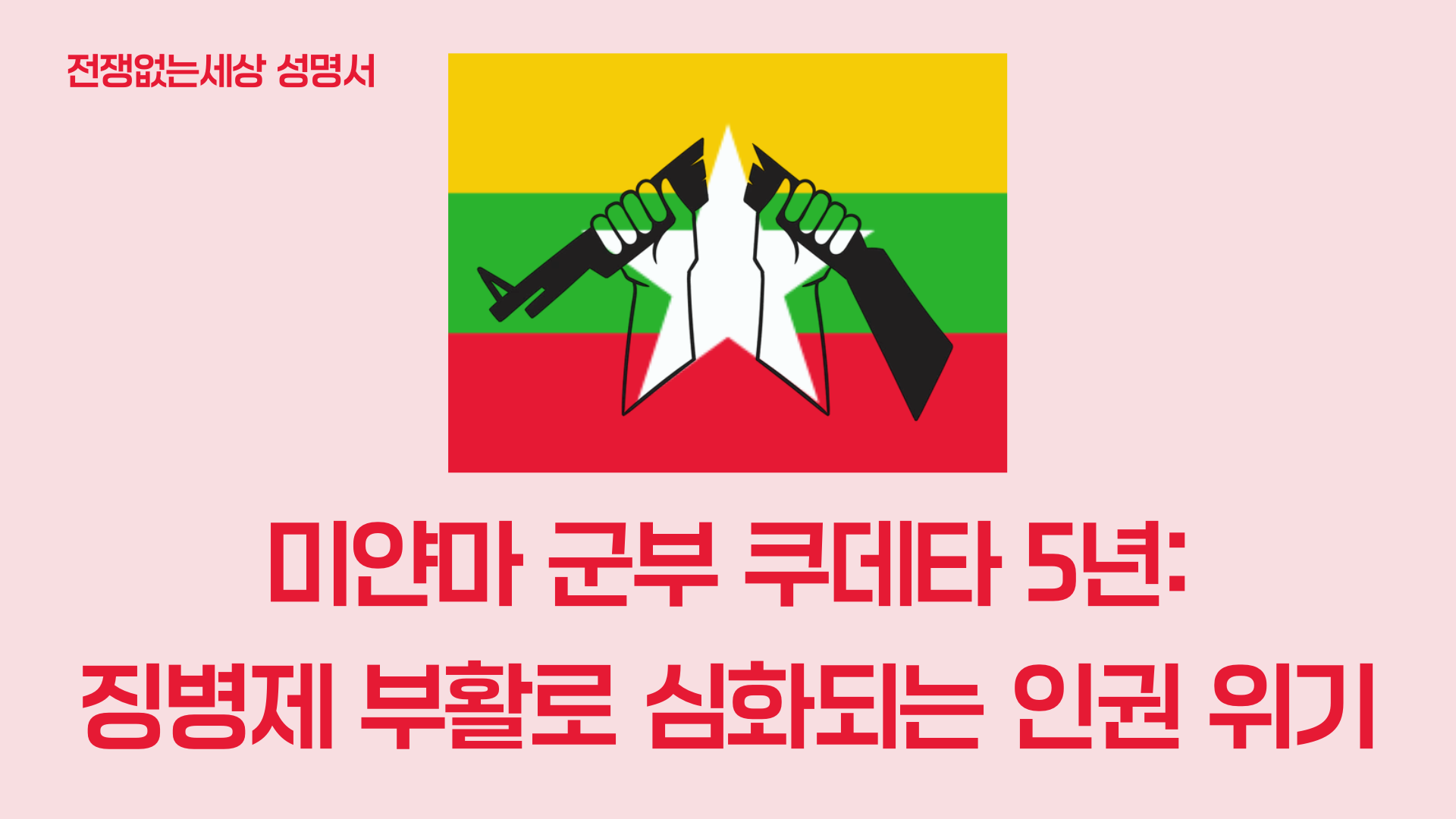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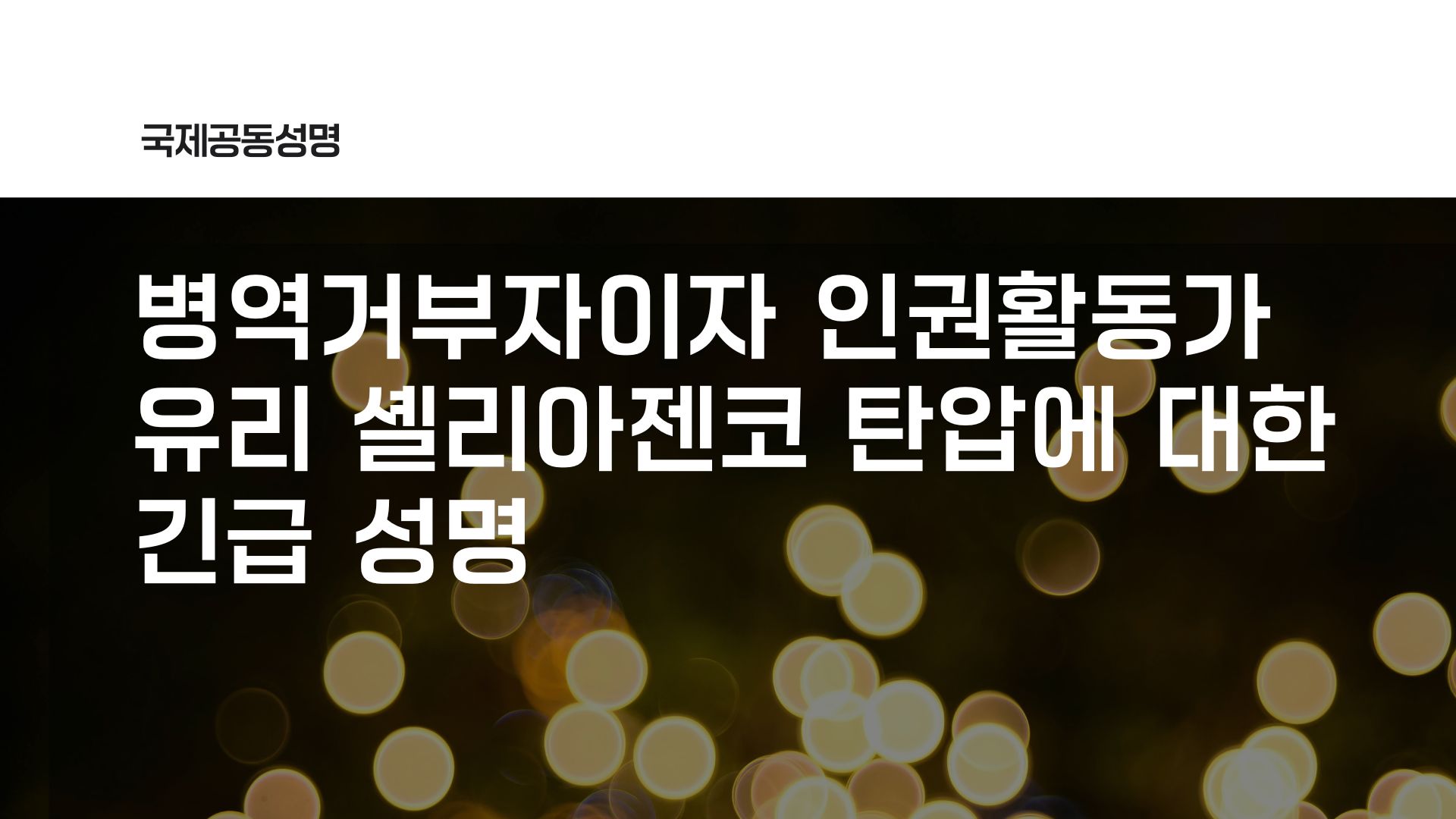

![[성명] 미얀마 군부 쿠데타 5년: 징병제 부활로 심화되는 인권 위기](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myanmar-45x45.png)
![[국제공동성명] 병역거부자이자 인권활동가, 유리 셸리아젠코 탄압에 대한 긴급 성명](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123123-45x45.jpg)
![[보도자료]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IMG_8696-45x45.jpg)
![[성명] 병역거부자를 가두는 나라에 양심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병역거부자 나단의 항소심 유죄 선고에 부쳐](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nadan-45x45.jpg)
![[평화를 살다] “요리하고 먹고 저항하라” – 팔라펠과 후무스](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2/5-45x45.jpg)
![[평화를 읽다] 역사를 품은 그림, 쓸쓸함을 알아차리는 다정함 – 『어느 쓸쓸한 그림 이야기』를 읽고](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2/book-45x4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