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참여연대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기후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한 해에만 9,970억 달러를 군사비로 사용해 왔고, 2020-2024년 전 세계 무기 수출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높은 군사비만큼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2022년 기준 배출량 63억 4천 300만mt)
그렇다면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군사부문 배출량을 어떻게 집계하며 보고하고 있을까.
기본적인 집계와 보고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 재탈퇴에 서명했다. 이어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 중인 넷제로 프레임워크를 ‘미국에 부과되는 글로벌 탄소세’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기후 정책 역행 위기에 처한 미국은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는 국가 중 한 곳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매년 발간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U.S. Greenhouse Gas Inventory)에는 국가 대기오염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군사부문도 포함돼 있다. 다만 1999-2022 인벤토리(24.04. 발행)에 따르면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군사 부문 배출량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미 국방부가 제공한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추산했다고 기재된 것에 그쳤다.
군사 배출량 전문 연구 기관인 ‘The Military Emissions Gap’은 미국의 군사 배출량 보고에 대해 “보고서 격차 매우 심각(Significant gap in reporting)”, “데이터 접근성 나쁨(Poor)”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본 프랑스의 사례와 데이터 접근성 면에서는 나쁨(Poor)으로 비슷했으나 배출량 보고 과정이나 내용에서 중요 사항이 제외되어 실제 데이터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발전기 등 고정된 연소 시설에서 배출되는 고정 배출량을 제외하고 항공기 등 연료를 사용하는 수송 수단에서 배출되는 이동 배출량(17.872MtCO2e)만 제공하고 있어 해당 부문의 전체 배출량을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A.5(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곳)항목에는 군사용 배출원과 함께 폐기물 소각, 화석 연료 연소 등 민간 배출원이 포함되었고, 스코프3(군사작전, 해외기지, 무기 제조, 전후 복구 등에 해당)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세계 곳곳에 기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의 이러한 행태를 통해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막대한 군사부문 배출량 중 일부만 공개하고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배출량 감축을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전체 배출량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군사부문 배출량 보고
기후·평화단체 CEOBS도 미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보고한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에 대해 ‘미흡-보고된 데이터가 명확하게 분리돼 있지 않음’ 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배출량 보고 수준도 미흡하지만 주요하게 볼 지점은 있다. 의회의 권한으로 미 국방부가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한 사례다. 비록 이후 행정명령으로 해당 의무는 폐지되었으나, 제출한 문서가 세부 내용이 포함된 군사부문 배출량 보고서라는 점, 매년 미 국방부는 대통령 산하의 환경품질위원회(CEQ)와 예산관리국(OMB)에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합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테면 22대 국회 비상설기구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국방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군사부문 배출량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기후 헌법소원 불합치 결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임을 선언했고, 국회는 이에 응답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방부의 경우 안보 상의 이유로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1.A.5 항목에 일부 보고가 되긴 했으나 군사용을 명시지 않아 국내 배출량은 ‘성역’에 있다.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와 보고가 절실하다. 21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5.5%가 군대에서 발생해 왔지만 기후위기 당사자인 시민들은 정확한 통계조차 접근할 수 없다.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군사부문 배출량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기후정의 없이 평화 없다
‘기후 정부’를 자처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일 국회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논의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9월 15일부터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는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가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안보라는 이름의 군사 활동이 되려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한반도 일대의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군사훈련은 기후위기 대응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시민의 안전한 내일을 만들기 위한 답은 군비 축소와 기후 정의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평화와 기후정의를 위한 글로벌 행동주간(Global Week Of Action For Peace And Climate Justice)이 실시된다. 함께 행동하자. 기후정의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기후정의 없다.
📍함께하기
9/23(화) <군대와 탄소발자국: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 발간 기념 온라인 워크숍
9/27(토) 기후정의행진에 피스메이커로 함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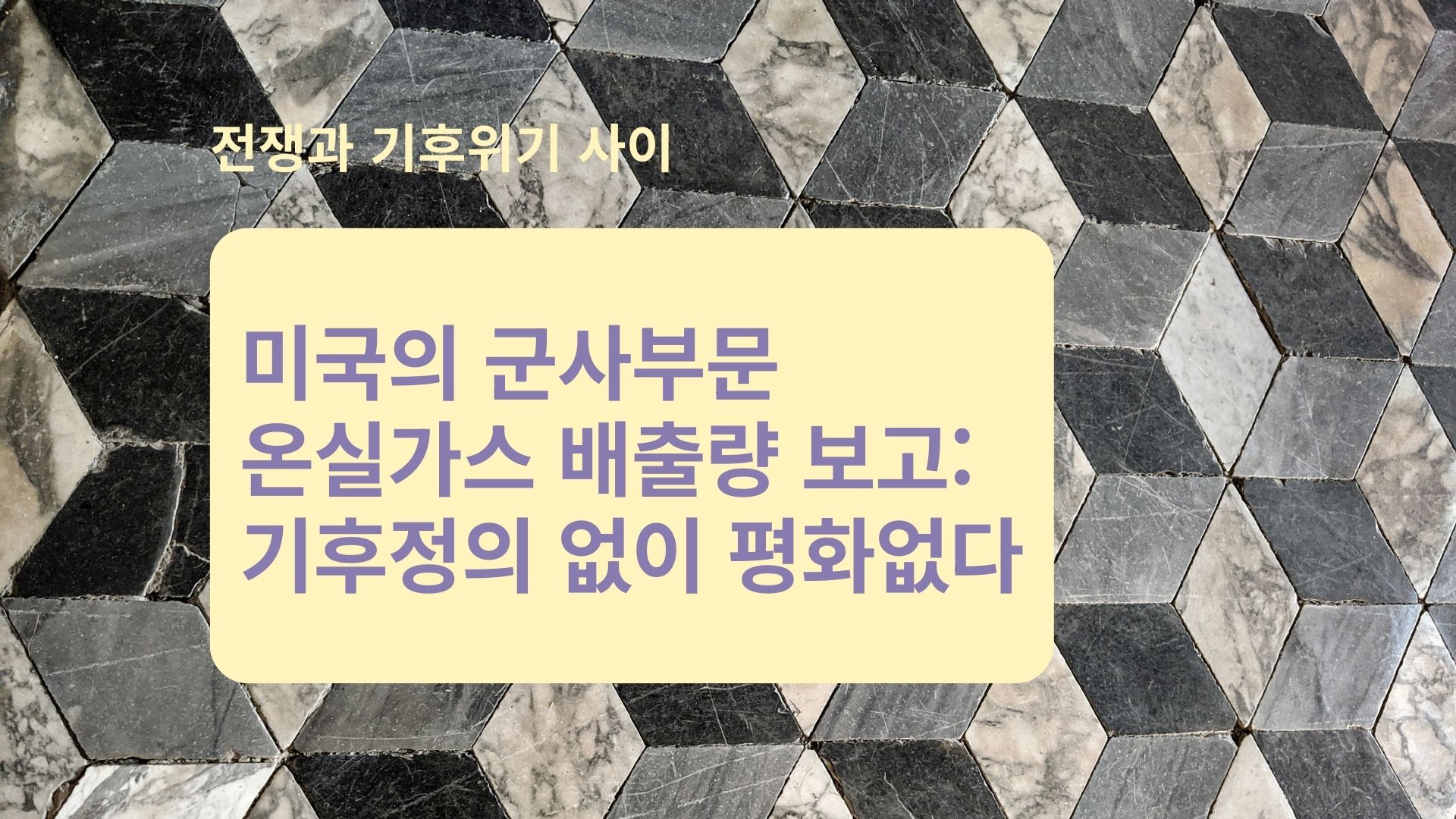



![[성명] 미얀마 군부 쿠데타 5년: 징병제 부활로 심화되는 인권 위기](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myanmar-45x45.png)
![[국제공동성명] 병역거부자이자 인권활동가, 유리 셸리아젠코 탄압에 대한 긴급 성명](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123123-45x45.jpg)
![[보도자료]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IMG_8696-45x45.jpg)
![[성명] 병역거부자를 가두는 나라에 양심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병역거부자 나단의 항소심 유죄 선고에 부쳐](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nadan-45x45.jpg)
![[평화를 살다] “요리하고 먹고 저항하라” – 팔라펠과 후무스](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2/5-45x45.jpg)
![[평화를 읽다] 역사를 품은 그림, 쓸쓸함을 알아차리는 다정함 – 『어느 쓸쓸한 그림 이야기』를 읽고](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2/book-45x4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