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면서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잠정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은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병무청은 병역거부자들의 입영영장을 간단한 심사를 거쳐 연기하고 있다. 11월 최초의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무죄 또는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도 많아졌다. 하지만 검찰의 게임이력조회라든지, 평화주의 활동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병역거부를 사칭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일은 아직까지 ‘양심의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국회에서도 대체복무를 규정한 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 후 쏟아져 나왔다.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발의된 3건의 대체복무 관련 법안에 더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8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김중로, 이종명, 이용주, 김학용, 김종대, 김진태, 이언주, 장제원) 법안들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까지 모두 12건의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대체복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19년 10월까지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는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언제 다시 국방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될 지 가늠할 수도 없다. 만약 국회가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 법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병역법 제5조 1항의 법률적 효력이 사라져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자신들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대체복무법을 빨리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어떤 대체복무법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무척 중요하다.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여러 차례 대체복무법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건을 이야기해왔다.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고, 현역 군인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군복무와 연관이 없는 공익적이고 공적인 영역의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입영대상자들이 병역거부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고지하며 어느 시점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비하자면 매우 늦은 대체복무제 도입이지만, 늦은만큼 가장 훌륭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대체복무 도입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하며, 하루 빨리 대체복무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2019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
전쟁없는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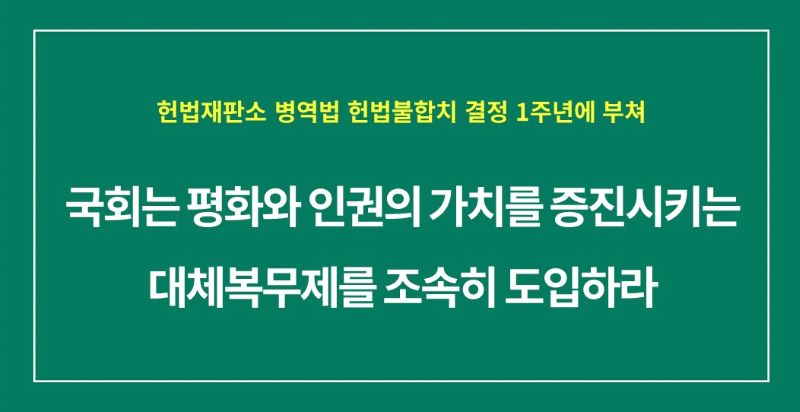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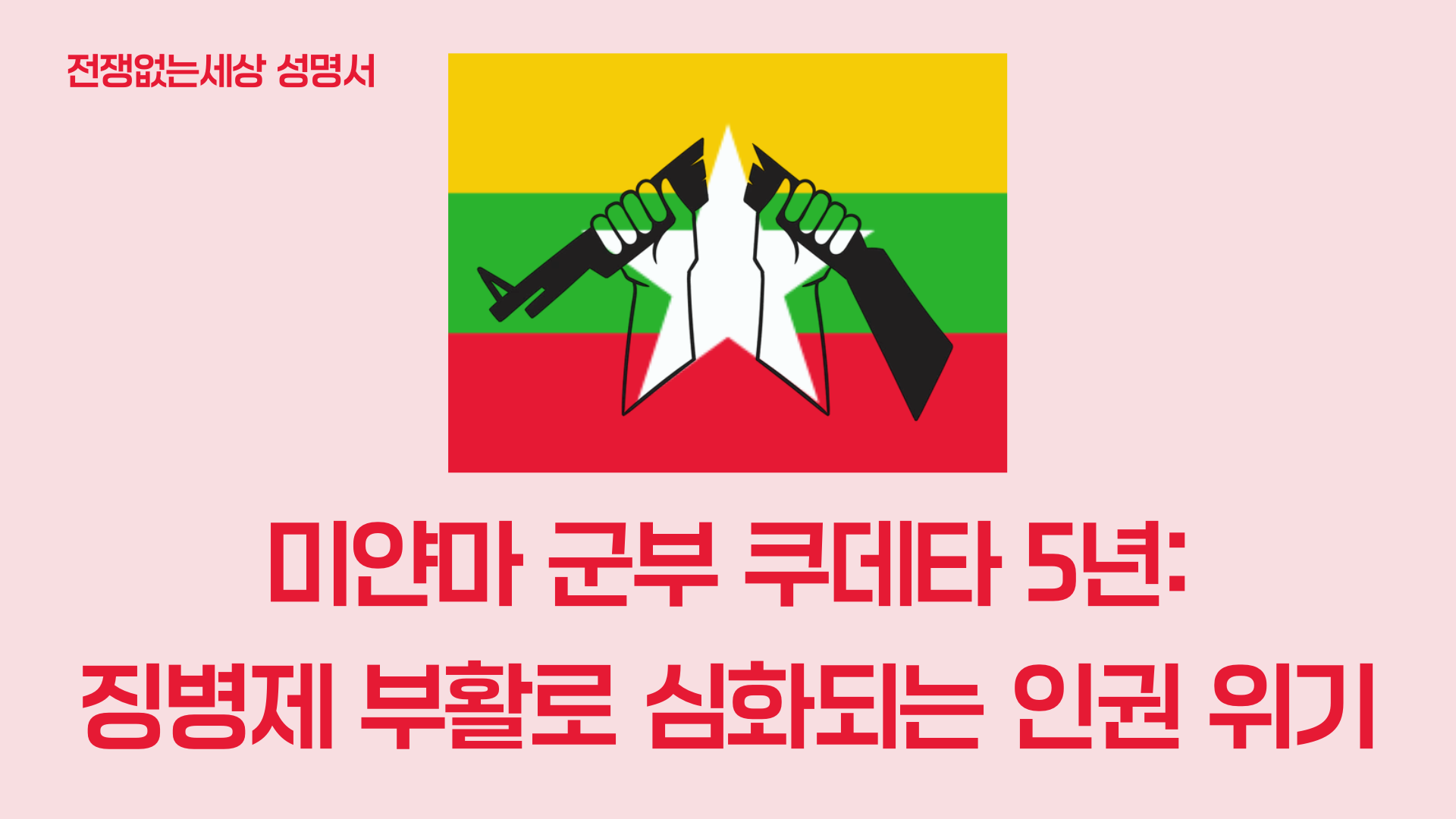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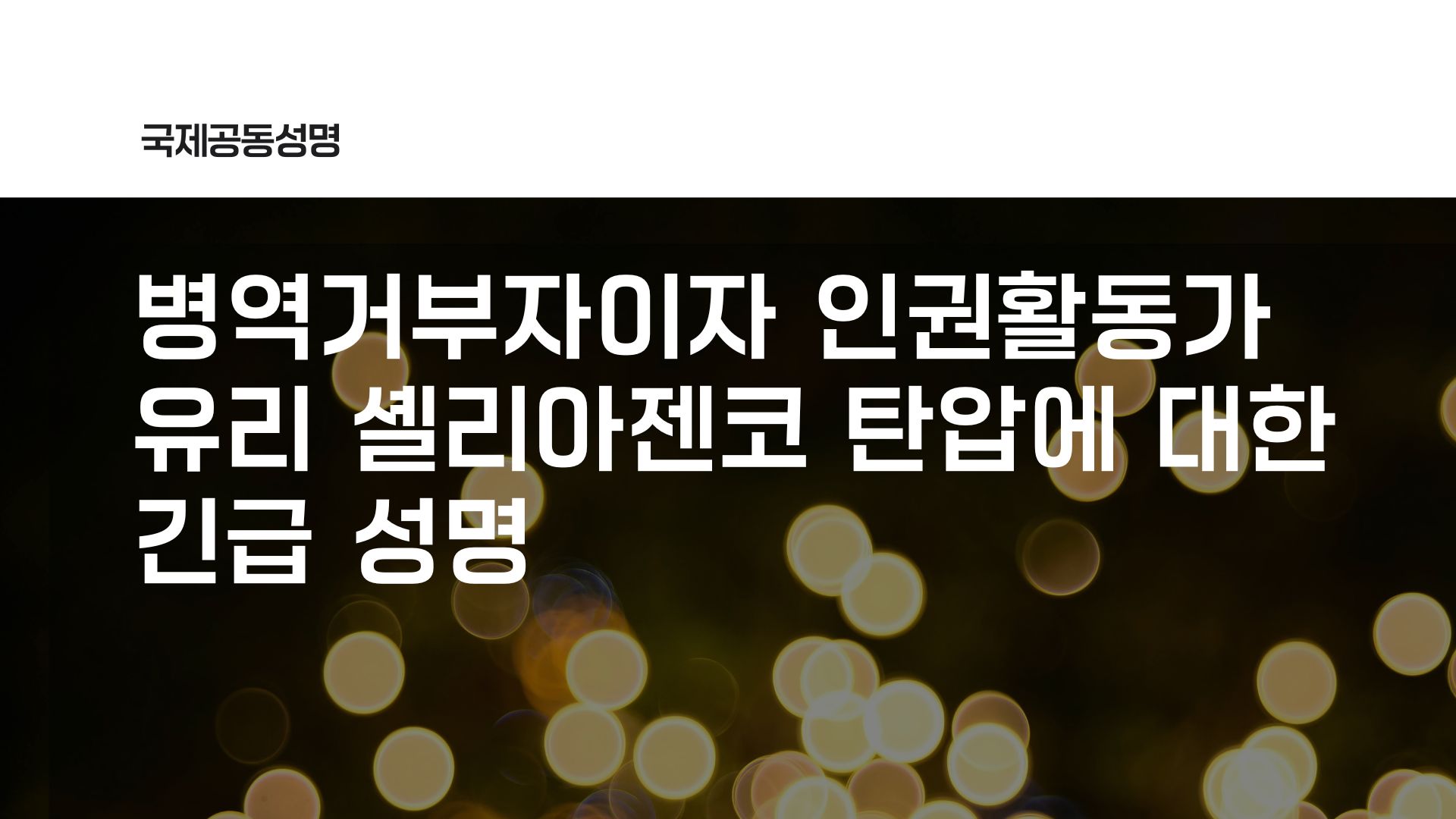

![[성명] 미얀마 군부 쿠데타 5년: 징병제 부활로 심화되는 인권 위기](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myanmar-45x45.png)
![[국제공동성명] 병역거부자이자 인권활동가, 유리 셸리아젠코 탄압에 대한 긴급 성명](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123123-45x45.jpg)
![[보도자료]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IMG_8696-45x45.jpg)
![[성명] 병역거부자를 가두는 나라에 양심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병역거부자 나단의 항소심 유죄 선고에 부쳐](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nadan-45x45.jpg)
![[평화를 살다] “요리하고 먹고 저항하라” – 팔라펠과 후무스](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2/5-45x45.jpg)
![[평화를 읽다] 역사를 품은 그림, 쓸쓸함을 알아차리는 다정함 – 『어느 쓸쓸한 그림 이야기』를 읽고](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2/book-45x4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