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일부로 확산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이 발효 4주년을 맞는다. 2014년 7월 말 현재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총 113개국에 달하며 이중 비준 절차를 완료한 당사국의 수는 84개, 서명 후 비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서명국은 29개다.
확산탄금지협약은 확산탄 사용, 생산, 이전, 비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당사국이 보유한 확산탄 비축분의 전면적 폐기, 오염 지역 정화,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 등의 의무를 규정한다. 동 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비준 8년 내 확산탄 비축분을 폐기해야하며 10년 내 오염지역 정화를 완료해야 한다. 협약 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의무도 획기적으로 평가된다. 협약은 확산탄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요구하며 각국에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확산탄금지협약이 이 분야에 관한 여타 국제협약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은 바로 동 협약이 국가 주도로 탄생한 유엔 협약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주도로 제정된 “아래로부터의 국제법”이라는 점이다.
세계 곳곳의 시민사회는 확산탄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비인도성(무차별적 피해 발생, 민간인 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확산탄의 비인도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최초에 이 문제는 특정 무기체계의 사용에 대한 제한 및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추가 의정서 채택을 놓고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 등은 확산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 제안에 강렬히 반대했으며 대신 일정한 불발률에 도달하지 못하는 확산탄만을 금지하자는 식으로 다소 연성적인 기준 설정을 시도했다. 결국 유엔 CCW 추가 의정서 채택으로 확산탄을 전면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노르웨이 정부가 2007년 2월 “오슬로 프로세스”로 알려진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족시켰키기게 된다. 노르웨이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노력 하에 2008년 5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확산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제 조약안에 대한 공식적인 교섭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확산탄금지협약이 최종 채택되었다. 같은 해 12월 오슬로에서 열린 조인식에서는 94개국이 협약에 서명했으며, 2010년 2월 16일부로 30개국의 협약 비준이 완료되면서 협약은 2010년 8월 1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현재까지만 무려 113개국이 확산탄을 비인도무기로 규정하고 이의 생산, 사용,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정부는“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들어 협약 가입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국은 대북 전차전력 및 방사포 무력화에 있어 확산탄을 핵심적인 대응전력으로 삼고 있다. 군에서 사용되는 한국에서는 한화와 풍산이 확산탄을 생산, 수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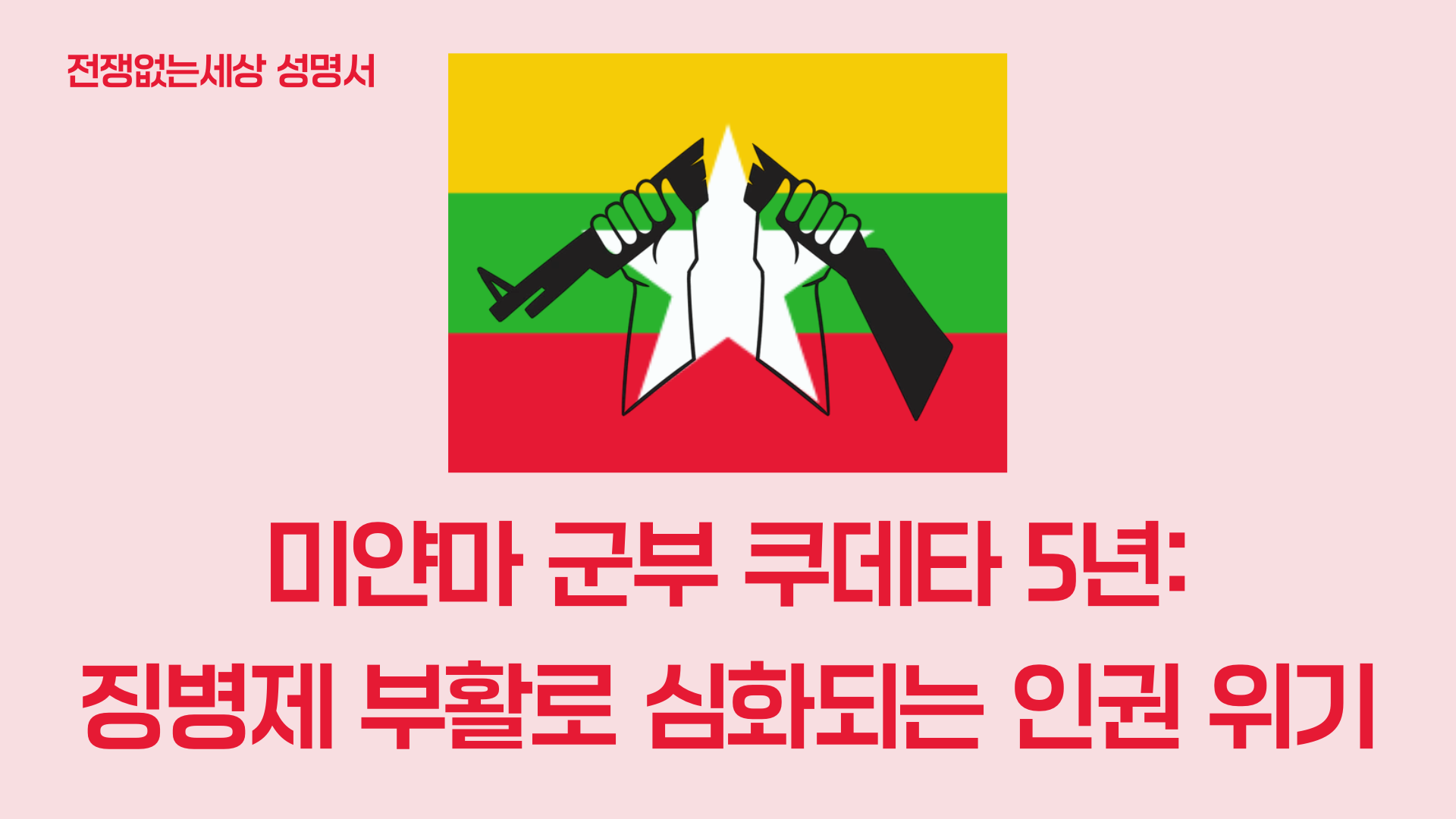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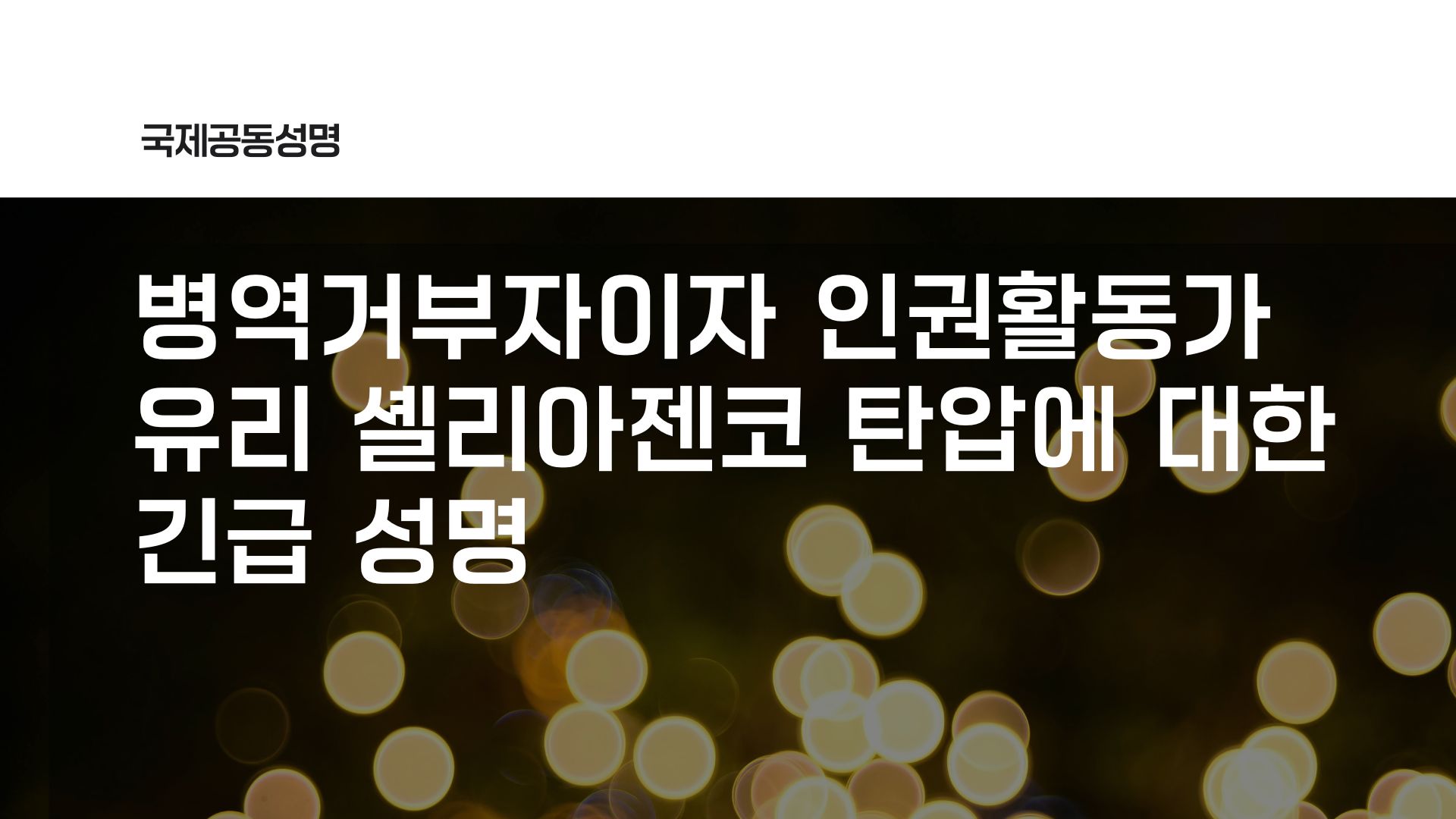

![[성명] 미얀마 군부 쿠데타 5년: 징병제 부활로 심화되는 인권 위기](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myanmar-45x45.png)
![[국제공동성명] 병역거부자이자 인권활동가, 유리 셸리아젠코 탄압에 대한 긴급 성명](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123123-45x45.jpg)
![[보도자료]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IMG_8696-45x45.jpg)
![[성명] 병역거부자를 가두는 나라에 양심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병역거부자 나단의 항소심 유죄 선고에 부쳐](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nadan-45x45.jpg)
![[평화를 살다] “요리하고 먹고 저항하라” – 팔라펠과 후무스](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2/5-45x45.jpg)
![[평화를 읽다] 역사를 품은 그림, 쓸쓸함을 알아차리는 다정함 – 『어느 쓸쓸한 그림 이야기』를 읽고](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2/book-45x4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