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늘해(전쟁없는세상 후원회원)
내가 처음으로 꿈꾸었던 일탈은 학교(중등교육)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대학 입시가 얼마나 사람을 피 말리게 하는지, 청소년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인권을 부정당해야 하는지 항상 ‘머리로는’ 분노했지만 직접 실천하지는 않았다. 나는 학교 바깥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왠지 거기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고,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계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학생인권운동가들을 존경했었다. 저 사람들은 나와 달리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너무 단순했고, 나쁘게 말하면 활동가들을 타자화하는 것이었다. 대학에 와서 어떤 활동가에게 내 환상에 대해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학교가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대답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나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조릿대 베개笹まくら』는 마루야 사이이치(丸谷才一)가 1966년에 쓴 장편소설이다. 부의금을 고민하던 한 남자가 파출소 앞에서 멈춰선다. 그는 강도 살인범 수배지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들이 안쓰럽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 털이범이 직원들에게 쫓기고 있는데, 남자는 털이범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마침내 직원들이 털이범을 붙잡았을 때도 그는 지켜만 본다. 그날 저녁 영화에서 경찰에 쫓기는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하기도 한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쫓기는 남자들을 동정하며 지냈다.”
그의 이름은 하마다 쇼키치. 현재는 평범한 사립대학 직원이지만, 1940년 10월에 징병을 기피한 사람이었다. 심지어 그는 5년 동안의 도주 끝에 ‘성공한 징병기피자’로서 종전을 맞이했다. 전후 20년 동안 그는 굴곡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를 둘러싼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 도주 시절 자신을 도와준 여성인 ‘아키코’가 죽었다. 그가 대학 직원으로 채용될 때 ‘병역’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둘 그가 징병기피자라고 조롱했다. 나중에는 그의 일자리도 위협받기 시작했다. 소설은 일본 전국을 돌며 도망치던 ‘스기우라 켄지’와, 20년이 지나 사회에 정착한 하마다 쇼키치의 시점을 번갈아 가며 전개된다. 이 소설의 독특한 점은 징병기피자 하마다의 ‘투쟁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징병기피’는 전혀 영웅적이지 않았다.
‘징병기피자’의 복잡한 마음
연회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일본 군가를 부른다.
“일본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산병선에서 꽃처럼 지자꾸나.”
다른 이들이 웃고 떠드는 동안 하마다는 혼자서 상념에 빠진다.
“산병선의 꽃처럼 지는 죽음을 두려워했던 나는 비겁한 자일까?”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징병을 기피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한다.
“리포트를 쓰듯이 나는 내 행위의 근거를 생각했다. 첫째,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반대. 둘째, 이 전쟁에 대한 반대. 셋째는…… 뭐였더라? 그 시절엔 술술 잘도 나왔는데. 허구한 날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근데 방금 마신 한 잔에 훅 취기가 오르는군. 셋째……, 생각났다. 군대 그 자체에 대한 반대. 넷째, 이 군대에 대한 반대.”
하지만 그의 생각은 계속 이어진다. 그저 군대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징병기피를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냥 일본군이 멋있지 않아서였던 건 아닐까? 겨우 그딴 이유로 다른 이들의 희생을 방관하고 있었던 것일까? 밤 기차에서 강제 연행된 조선인 아이를 마주쳤을 때 그저 보고만 있었던 자신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하마다에겐 너무 많은 죄책감이 있었다. 도망친 이후 어머니가 자살한 것, 군에 입대한 동생이 상관에게 맞아서 고막이 터진 것, 친구에게 말없이 떠나버려 결국 ‘배신’하게 된 것…… 모두 자기 잘못이지 않을까, 하마다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그는 확고한 신념으로 국가에 저항하는 ‘투사’보다는, 사람들이 뒤에서 비웃는 말들을 신경 쓰고 자기 일자리를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의 도주 생활도 영웅적인 저항이 아닌 하루하루 붙잡힐 걱정, 먹고살 걱정을 해야 하는 불안의 연속이었다. 우파 잡지가 그를 비난하고 학교도 그를 좌천시키려고 할 때 하마다는 눈에 띄는 일을 피하고 싶어한다. 그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지키고 싶어한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했던 선택을 확신하지 못할지언정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마다의 특징은 ‘군필자들’과의 대비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군필자’들
이 소설엔 두 명의 ‘군필자’가 등장한다. 하마다의 직장 선임인 ‘니시 마사오’. 니시는 하마다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인물이다.
염병할. 모두 쉽게 죽어버렸어. 나만 살아남았고. 아아, 그 녀석들한테 미안하다. 왜 난 살아남았을까. 그래서 난 전쟁이 싫다니까.
(…)
야, 하마다 쇼키치.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둬. 어쨌든 난 싫어도 군대에 갔고, 넌 가지 않은 거야.
그 차이를 알겠어?
오다와라의 여관집 아들도 그랬어. 그리고 내 분대원들도, 소대원들도 다 그랬단 말이야.
알겠어? 그 차이를.
하마다를 제외하면 니시는 유일하게 독백하는 인물이다. 그들은 연회에서 군가를 부르며 군인 시절을 안줏거리 삼지만, 그 밑에는 부조리에 대한 울분, 자기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 배고프고 힘들었던 전장에서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 억울함과 울분은 자신을 전장에 보낸 국가가 아니라 전쟁의 고통을 겪지 않고서도 승승장구하는 ‘징병기피자’ 하마다에게 향한다.
또 다른 인물은 프랑스어 조교수 ‘구와노’로, 그는 자신이 군대에서 얻어맞은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하마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마다 씨는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야. 그딴 곳에 안 간 것은.”
구와노가 이런 말을 한 목적은 ‘징병기피자’인 하마다에게 호의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하마다는 자기 앞에서 군대 얘기를 늘어놓는 구와노를 거북해 했다. 나는 힘들었지만, 당신은 그런 곳에 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것은 하마다의 도주 생활이 군 생활보다 나았다는 전제에서 나온 얘기였다. 구와노는 하마다에게 덕담을 해주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하마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 두 군필자의 이야기에는 자기밖에 없다. 이들은 자기 군 생활을 떠올리며 괴로웠던 것만 기억한다. 니시는 전선에서 만난 “정신대”(일본군 ‘위안부’) 여성에게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 구와노는 하마다의 기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은 전후 일본은 물론 한국까지도 아우르는 ‘군필자’의 어떤 억울함과 자기연민을 드러낸다. 분명 이들의 경험은 부조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와 자신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는 성찰하지 않는다. 반대로 하마다는 강제 징용된 조선인 소년에게 연민을 느끼고, ‘자길 대신해서’ 죽었을지 모르는 전사자에게 죄책감을 느낀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와 연루된 여러 사람에게 죄의식을 가진다. 비록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하마다에겐 전쟁과 국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다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 있었다.
‘아키코’와 ‘요코’의 시각에서 다시 쓴다면
하지만 그 감수성은 ‘여성’에게까지 미치지는 못한다. 이 소설은 상당히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쓰인다. 하마다는 종종 자신의 ‘남성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기도 하고, 여성과의 교제 속에서 남성성을 보증받으려고도 한다. 하마다는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아내 ‘요코’와 도주 생활 후반기에 만나 도움을 받은 ‘아키코’를 비교하는데, 이는 하마다를 둘러싼 두 시대(전중/전후)를 상징한다. 어쩌면 ‘남성성’이라는 키워드로 이 작품을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에게 아키코는 1년 남짓 함께 지낸 사이지만 매우 각별한 존재로 남아 있다. 때때로 과거의 아키코는 현재 하마다의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어준다. 낭만, 결실을 보지 못한 “하룻밤 풋사랑”. 그래서 소설에서 아키코는 하마다의 입장에서만 그려질 뿐, 그녀 자신의 이야기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아키코에게 전쟁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는 수상해 보이는 하마다에게 끌렸고, 그와 함께 도주 생활을 했을까? 아키코는 왜 어머니와 불화하면서 자주 ‘가출’을 했을까? 그녀가 있는 마을에 폭격이 날아들었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 만약 이 소설을 아키코의 입장에서 다시 쓴다면, ‘조릿대 베개’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 하마다는 아키코가 왜 자신과 함께했는지 모른다. 그저 은인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전쟁은 남성만의 일이 아니다. 도망과 ‘기피’도 하마다만의 일은 아니었다. 소설 속 두 여성, 요코와 아키코는 무언가와 계속 불화하고 일탈한다. 그들은 무엇이 두려웠던 걸까? 그 경험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었다면, 하마다가 아닌 아키코와 요코의 입장에서도 말해질 수 있었다면, 하마다의 독백에서 더 나아간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한 남자의 고독함을 넘어서
이 책의 원서 초판본 띠지에는 아래와 같이 저자의 말이 적혀 있다.
徴兵令が布かれてから敗戰の日までの長い歳月のあいだ、日本の青年たちの夢みる最もロマンチックな英雄は、徴兵忌避者であった。彼らはみな、この孤独な英雄の、叛逆と自由と遁走に憧れながら、しかし、じつに従順に、あの、黄いろい制服を着たのである。そう、ぼく自分もまた。……僕の長編小説 『笹まくら』 700枚は、そのようなかつてのぼくの従順さに対する錯綜した復讐となるであろう。
징병령이 내려지고 패전의 날까지 긴 세월 동안, 일본 청년들이 꿈꾸는 가장 낭만적인 영웅은 징병기피자였다. 그들 모두 이 고독한 영웅의 반역과 자유와 도주를 동경하며, 그러나 실은 온순하게, 저 노란 제복을 입었던 것이다. 그렇다, 나 또한 그랬다. ……내 장편소설 『조릿대 베개』 700매는 그처럼 지난날의 내 온순함에 대한 복잡한 앙갚음이 될 것이다.
저자도 1945년 3월에 군에 입대했다가 전장에 보내지기 전에 종전을 맞이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도망가고 싶었지만, 실은 온순하게 노란 제복(군복)을 입었던 사람이었다. 1960년대 일본 사회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선택을 하마다 쇼키치, 그리고 스기우라 켄지에게 투영하면서 썼을 것이다.
소설 속 하마다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고민을 나누지 않는다. 그는 고독하다. 혼자 과거를 떠올리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 혼자만의 싸움에 마주한다. 쉽게 타인의 호의와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도주 생활의 기억과 점점 우경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폭력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하마다는 아내 요코의 일탈(도둑질)을 알고 불현듯 깨닫고는, ‘자유’를 향한 갈망을 드러낸다. 이것은 하마다의 결심일까, 체념일까?
게다가 하마다는 지금의 세상에서 가장 엄중한 규율…… 훔치지 말라는 규율과 죽이지 말라는 규율보다도 훨씬 무거운 규율을…… 어긴 남자니까. 어겨버린 남자니까. 국가와 사회와 체제에 한번 반항한 자는 마지막까지 그 반항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되돌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위험한 여행의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 그래, 위험한 여행, 불안한 여행, 조릿대 베개.
하마다 쇼키치/스기우라 켄지라는 평범한 남자, 너무나도 복잡한 심정을 지닌 이 ‘징병기피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징병기피자’라고 하는 명칭이 까끌까끌했다. 왜 ‘병역거부자’가 아닐까? 반드시 종교적인 신념이든 굴할 수 없는 양심이든, 혹은 군대를 변화시키겠노라는 목적이든 좀 더 ‘대의’가 있어야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는 암묵적인 생각들. 하지만 한국에서 대부분의 탈영병, ‘병역기피자’들은 별로 대단하지 않다. 군대가 싫어서, 죽기 싫어서, 맞기 싫어서, 다른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술 마시다가,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그들은 때때로 국가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택한다. 치밀한 계획일 수도 한순간의 충동일 수도 있다. 그들은 붙잡혀서 반성문을 쓰거나, 진심으로 후회하며 군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들의 경험은 사사로워서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군인이 아니었다. 군대의 강고한 규율도 이들을 충분히 군인으로 만들지 못했다. 군인이 되지 않았기/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아직 국가가 몸과 마음에 자리 잡기 이전의 생각들은 바깥을 그려볼 수 있는 상상력을 주는 것이 아닐까? 아이러니하게도 군대를 제일 많이 변화시킨 것은 어떤 식으로든 군대에 반항했던 이들이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이것을 한 남자의 고독한 반역과 자유와 도주로 남겨둘 수는 없다. 하마다의 징병기피가 요코와 아키코의 일탈, 니시 마사오와 구와노의 슬픔과 울분으로 연결되고, ‘우리 모두의 반역과 자유와 도주’가 되었을 때만 더 많은 상상력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입장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좀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미약하지만, 감수성마저 국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쳐볼 수 있을 것이다. 나 혼자만의 고독한 앙갚음이 아니라, 전쟁과 국가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이들과 함께 평화와 정의에 대해 질문하고 고민하고 싶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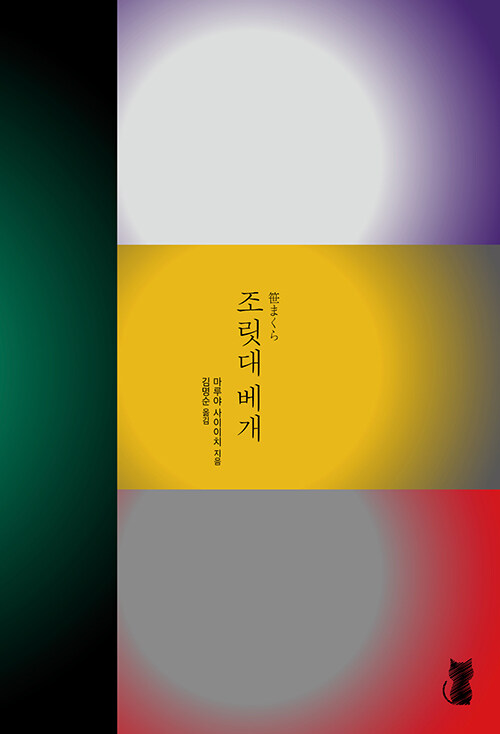
*[평화를 읽다]는 전쟁없는세상 블로그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책 서평을 모아 놓은 꼭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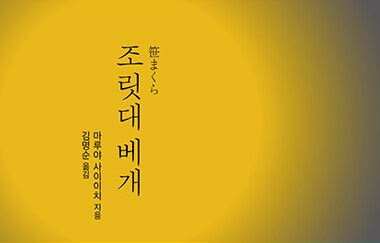



![[성명] 미얀마 군부 쿠데타 5년: 징병제 부활로 심화되는 인권 위기](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myanmar-45x45.png)
![[국제공동성명] 병역거부자이자 인권활동가, 유리 셸리아젠코 탄압에 대한 긴급 성명](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123123-45x45.jpg)
![[보도자료]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IMG_8696-45x45.jpg)
![[성명] 병역거부자를 가두는 나라에 양심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병역거부자 나단의 항소심 유죄 선고에 부쳐](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nadan-45x45.jpg)
![[평화를 살다] “요리하고 먹고 저항하라” – 팔라펠과 후무스](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2/5-45x45.jpg)
![[평화를 읽다] 역사를 품은 그림, 쓸쓸함을 알아차리는 다정함 – 『어느 쓸쓸한 그림 이야기』를 읽고](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2/book-45x45.jpg)

